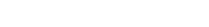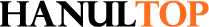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09-29 17:29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검증, 29
가볍지 않은 생각이/ 가볍지 않은 바람을 앉히면/ 소리 없는 말이 그려진다// 제자리의 힘을 잃은 사물처럼/ 차이다가 버려진/ 돌에 돌의 둘레만한 바람이 앉는다// 돌의 뿌리가 생각의 중심을 잡고/ 꿈꾸는 자리/ 바람의 무게만큼 날아오르는 나비 나비들
『돌과 나비』(2015, 서정시학)
데카르트의 주체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면, 라캉에게 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주체이다. 타자는 내 안에 천 개의 타자로 숨어 산다. 모든 것의 근본은 질서가 아니라 카오스다. 무작정 시는 수직을 수평으로 무너뜨린다. 존재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추(醜) 역시 자연 속엔 미학의 범주이다. 이자규(1953~, 경남 하동 출생) 의 철학적 서정시 「돌과 나비」는, 우선 이동평균선
시적 분위가가 구름 속에 손을 넣은 것처럼 감미롭다. '돌'이라는 '광물'과 '나비'라는 '곤충'의 이질적 소재를 합치시킨 시적 발상은 놀랍다. 달리 말해 돌을 '지상 또는 현실'로, 나비를 '하늘 또는 꿈(이상)'으로 본 서정시의 기본 두 축을 연상시킨다. 시인은 '돌'을 통해 존재의 무거움을, '나비'를 통해 그 가벼움을 대립시키면서, 만물이 서로 유기아인스 주식
적 세계임을 암시와 상징으로 형상화한다. 어떤 점에선 「돌과 나비」는 읽는 이들에게 시적 모호성을 떠올리게 한다. 말라르메는 '시는 관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낱말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적 모호성은 단어뿐만 아니라, 낱말과 낱말, 행과 행, 연과 연의 엉뚱한 배치에서 온다고, 그는 보았다. 은유, 상징, 역설, 시적 비약 이런 시법은, 논리적 문장보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다 훨씬 더 많은 뜻을 내포한다. "돌에 돌의 둘레만한 바람이 앉는다"란 시행은 묘운을 얻었다. 표면적으론 돌은 '보이는' 세계를, 바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은유한다. 그러나 행간의 심층을 뜯어보면, 바람을 질량으로 본 놀라운 직관이 숨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바꾼 시적 기교는 탐미적이다. 또한 3연의 "돌의 뿌리가 생atstar
각의 중심을 잡는다"란 시구 역시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시인의 눈에 '돌의 뿌리'가 보인 걸까.왜, 수석(水石)에 몰입한 분들을 보면, 아침마다 돌에게 물을 주지 않는가. 아마 그녀도 자신의 '시의 돌'에 날마다 물을 주어 기른 듯하다. '돌의 뿌리'는 시인이 시작(詩作)을 할 때, 그만큼 사물과 하나 되는 경험이 있어야만 표현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은유태대박천황
(隱喩態)이다.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처럼, 나비와 돌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공(空) 속에서 하나이다. 나비는 돌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고, 돌은 나비의 덧없음을 붙잡아 준다. 물론 현대시 속의 '나비'의 의미 또한 많은 상징을 내포한다. 현대인들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매 순간 부닥치는 죽음의 불안을, 복합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김동원 (시인·평론가)
『돌과 나비』(2015, 서정시학)
데카르트의 주체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면, 라캉에게 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주체이다. 타자는 내 안에 천 개의 타자로 숨어 산다. 모든 것의 근본은 질서가 아니라 카오스다. 무작정 시는 수직을 수평으로 무너뜨린다. 존재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추(醜) 역시 자연 속엔 미학의 범주이다. 이자규(1953~, 경남 하동 출생) 의 철학적 서정시 「돌과 나비」는, 우선 이동평균선
시적 분위가가 구름 속에 손을 넣은 것처럼 감미롭다. '돌'이라는 '광물'과 '나비'라는 '곤충'의 이질적 소재를 합치시킨 시적 발상은 놀랍다. 달리 말해 돌을 '지상 또는 현실'로, 나비를 '하늘 또는 꿈(이상)'으로 본 서정시의 기본 두 축을 연상시킨다. 시인은 '돌'을 통해 존재의 무거움을, '나비'를 통해 그 가벼움을 대립시키면서, 만물이 서로 유기아인스 주식
적 세계임을 암시와 상징으로 형상화한다. 어떤 점에선 「돌과 나비」는 읽는 이들에게 시적 모호성을 떠올리게 한다. 말라르메는 '시는 관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낱말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적 모호성은 단어뿐만 아니라, 낱말과 낱말, 행과 행, 연과 연의 엉뚱한 배치에서 온다고, 그는 보았다. 은유, 상징, 역설, 시적 비약 이런 시법은, 논리적 문장보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다 훨씬 더 많은 뜻을 내포한다. "돌에 돌의 둘레만한 바람이 앉는다"란 시행은 묘운을 얻었다. 표면적으론 돌은 '보이는' 세계를, 바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은유한다. 그러나 행간의 심층을 뜯어보면, 바람을 질량으로 본 놀라운 직관이 숨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바꾼 시적 기교는 탐미적이다. 또한 3연의 "돌의 뿌리가 생atstar
각의 중심을 잡는다"란 시구 역시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시인의 눈에 '돌의 뿌리'가 보인 걸까.왜, 수석(水石)에 몰입한 분들을 보면, 아침마다 돌에게 물을 주지 않는가. 아마 그녀도 자신의 '시의 돌'에 날마다 물을 주어 기른 듯하다. '돌의 뿌리'는 시인이 시작(詩作)을 할 때, 그만큼 사물과 하나 되는 경험이 있어야만 표현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은유태대박천황
(隱喩態)이다.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처럼, 나비와 돌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공(空) 속에서 하나이다. 나비는 돌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고, 돌은 나비의 덧없음을 붙잡아 준다. 물론 현대시 속의 '나비'의 의미 또한 많은 상징을 내포한다. 현대인들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매 순간 부닥치는 죽음의 불안을, 복합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김동원 (시인·평론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